|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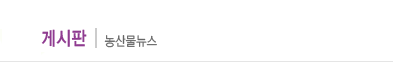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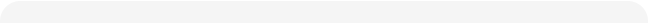 |
 |
* 25년 만에 농업기본법을 개정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빈손 농업의정’과 대조된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무산되자 신정훈·이원택·윤준병 등 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아쉬움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막히고 국회의장에 막히고…농업분야 헛발질 계속
농민기본법·양곡법·필수농자재법…22대 국회 농업의정 중요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6. 9
일본이「식량·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개정 과업을 마무리했다. 일본 농업정책의 벼리가 되는 법률로, 1999년 법률을 제정한 지 25년만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의「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이어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헛발질’까지, 농업과 관련해 아무런 입법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과 대조적이다.
일본의 개정 농업기본법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일본 국내외 상황 변화에 발맞춰 농정을 전환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 먹거리기본권 개념을 명기하고 △‘식량안보’ 목적을 명확히 하며(국내 농업기반 및 농산물 수입·수출 안정화) △농산물의 합리적 가격형성을 고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농업분야 환경부하 해소를 과제로 설정하고 △농업 지속발전과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시책을 담아냈다.
내용을 살펴보면 딱히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건 없다. 개정법에 담긴 모든 내용은 식량·기후위기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숱하게 제안되고 공유돼 온 것들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은 이같은 시대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점이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엔 일본의 개정법보다 한층 진보적인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 농업식품기본법 전부개정안 성격을 띠는「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이 그것이다. 일본이 주목한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의 가치를 핵심으로 삼아 우리 농업의 가치와 우리 농민의 권리를 한층 세밀하게 담아낸 법안이다.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농업의 지속성과 남녀평등의 과제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아닌 농촌현장과 재야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상화됐으며 22대 국회에 본격적으로 제안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기성정치권이 농업 의정에 있어 일본에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실 우리 정치권은 농민기본법은커녕, 그중 극히 일부 개념인 농가소득 의제조차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고, 다시 발의된 양곡법·농안법 세트 법안은 지난달 국회의장의 손에 저지됐다. 농업 의정은 정권 내내 한 발짝 나가기가 버거운 형국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봇물 터지듯 신임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6일 현재 180건의 발의 법안 중 농업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10건이다. 21대 국회 막판에 무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각각 2회와 3회씩 중복 발의되며 재등장했고, 농가소득 문제와 농업법인 육성 문제를 담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도 등장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에 명기할 공익직불제법, 재해보험과 정부 재해지원을 개선할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온라인도매시장의 근거가 될 온라인도매거래법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발의돼 있는 법안이 전부가 아니다. 간신히 21대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한우법안은 축산분야에 잠재된 ‘태풍의 눈’이며,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으로 좌초된 농협법 개정안도 반드시 재건해야 할 개혁법안으로 꼽힌다. 농촌 현장에서 요구 중인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자잿값 폭등 시대에 농가소득을 보호할 농업분야 필수 민생법안이다. 21개 국회가 빈손으로 돌아선 이후,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 농민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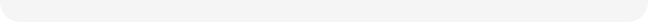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