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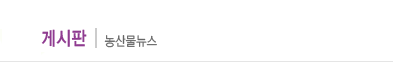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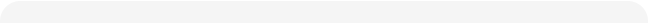 |
| [한국농어민신문] “고령농 안정적 노후보장, 은퇴 유도해야 농업 세대교체 가능”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28 |
조회 |
544 |
| 첨부파일 |
334837_71947_321.jpg |
 |
 |
*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연속토론회 중 제2차 토론회로 ‘미래산업으로의 농업발전방안 토론회’가 26일 열렸다
민주당 농업발전방안 토론회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확대
ha당 80~100만원으로 높이고
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해야
중소농 퇴직연금제 도입
국가 비축농지 확대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2. 28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세대 교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고령농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 청년농들에게 농지가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금의 소농 구조를 벗어나려면 국가 비축농지를 확대하고, 직불금과 상속 등으로 인해 계속 쪼개지고 있는 농지를 집적화·규모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월 26일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의 농업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연속토론회 중 제2차 토론회였다.
토론회 화두는 농업구조 개선이었다. ‘고령화’되고 ‘소농화’된 농업구조를 바꿔야 농가 소득 향상과 산업으로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 농가 수는 2020년 103만5000호에서 2023년 99만9000호로 줄어든 반면 농업경영체는 같은 기간 174만5000개에서 184만개로 늘었다. 농가당 경작 면적은 1.6ha. 유럽 17.4ha, 일본 3.1ha와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작다. 0.2ha 미만 소규모 경영체 비율은 2019년 48%에서 2023년 51.1%로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52.6%에 달한다.
임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령농에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농지로부터 은퇴할 수 있게 하고, 청년농에겐 농업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ha당 월 50만원, 1년에 600만원이 지급된다. 1ha를 농사지었을 때 기대수익이 900만원 정도로, 900만원의 67%를 계산한 수치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는데, 3000ha 목표에 실적은 1000ha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ha당 80~100만원으로 높이고, 농지가 없어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자“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농사지어서 1ha당 1200만원을 벌 자신이 없다면 이 제도를 선택할 것이며, 농협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한 지역농협 운영 차질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을 보조하고, 소상공인이 30년간 15만원을 내면 복리로 계산해 만기시 1억5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임 의원은 “일본은 1971년부터 농업자 연금제도를 도입해 농업 소득이 900만엔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를 위해선 농지의 교환과 분합을 주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국가 비축농지 매입 예산을 매해 2조원 이상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은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면서 “소농직불금이 대표적인데, 이같은 정책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농지의 규모화나 집적화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로 지난 30년간 농로 등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다음 세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농업구조 개편은 강제적 패널티로는 불가능하고 은퇴직불제 같은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규모화를 한다는 건 결국 농촌 공동체가 더 축소된다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적정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효율성과 경쟁력만 따지면 농업은 더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농가 소득과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감안, ‘물가 완충 비용’으로서 그동안 준비해 온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민들도 만족하고, 국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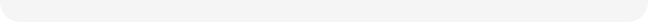 |
|
| |
|
|
|
|
|
|
|
